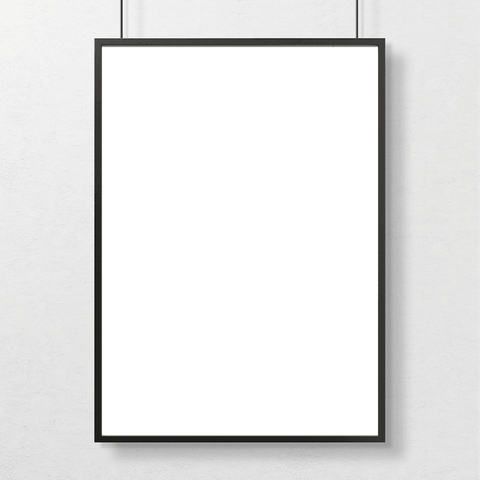전시 상세


홍지윤 스타일
(Hong Jiyoon Style)
전시서문 Exhibition Foreword
금호미술관 초대전 《홍지윤 스타일 Hong Jiyoon Style》은 작가 홍지윤(b. 1970)의 스물 세번째 개인전으로 지난 30년간 전개된 작업 세계의 순간들을 함께 돌아보고자 기획되었다. 문학적 모티브와 시(時), 강렬하고 화려한 색채의 퓨전 동양화로 알려진 홍지윤은 동양 화단에서 새로운 장르의 길을 개척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양식을 구축해왔다.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삶과 죽음 등 상반된 것들이 유연하게 부딪히고 융합하며 함께 공존하는 것을 작업의 기조로 삼았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시대와 매체의 작품들을 한 장소에 모아 ‘홍지윤의 스타일’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3F 밖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작가는 수묵의 물성에 집중하며 동양적 사유 체계를 토대로 작업 형식의 기반을 다진다. 이 시기의 작업들은 천에 수묵으로 칠하고 그 위에 아교와 방해말을 섞어 표면에 도포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캔버스에 광목천을 덮고 넓적한 붓으로 먹의 농담을 조절하여 바다를 표현한 수묵 추상 회화 <움직이는 사유. 바다> (2003)는 수묵 영상 작업 <큰새 '붕(鵬)'>(2003)의 배경으로 자리하기도 한다. 「장자』의 「소요유」를 주제로 존재의 사유를 다룬 작업 <큰새 '붕'>은 이후 작가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되는 '색동 새'의 시초이며, 작가의 사유의 과정과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열린 장이 되어준다.


 <사유의 풍경>, 1999, 천에 수묵, 방해말, 162x130cm
<사유의 문>(1998)과 <사유의 풍경>(1999)은 작가가 채색화와 수묵화를 오가며 동양화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던 시기에 제작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전통 채색화의 동시대적 구현을 추구했던 작가는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수묵의 물성 그 자체에 집중하며 이전 작품들과는 분위기가 다른 대형 수묵 추상 작품을 선보였다. 천에 먹을 칠하고 그 위에 아교와 돌가루를 섞어 도포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이 수묵화는 단색화처럼 고요하고 사색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이 작품들은 1999년에 열린 작가의 세 번째 개인전 《사유의 문》에 출품되었다.
<사유의 풍경>, 1999, 천에 수묵, 방해말, 162x130cm
<사유의 문>(1998)과 <사유의 풍경>(1999)은 작가가 채색화와 수묵화를 오가며 동양화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던 시기에 제작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전통 채색화의 동시대적 구현을 추구했던 작가는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수묵의 물성 그 자체에 집중하며 이전 작품들과는 분위기가 다른 대형 수묵 추상 작품을 선보였다. 천에 먹을 칠하고 그 위에 아교와 돌가루를 섞어 도포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이 수묵화는 단색화처럼 고요하고 사색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이 작품들은 1999년에 열린 작가의 세 번째 개인전 《사유의 문》에 출품되었다.
-3F 안 홍지윤은 시와 글씨가 기반이 되는 수묵화를 탐구하면서 동양의 전통적인 정서를 현대의 매체와 이미지로 재해석한다. <애창곡>(2010)에서 작가는 화선지 위에 오방색과 형광색의 아크릴 물감으로 선을 긋고 색동 꽃을 그려 생동감 넘치는 공간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사이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랑을 주제로 하는 가요의 노랫말을 채워 넣는다. 이와 함께 작가는 색동 새가 날아다니는 영상을 배경으로 스탠드 마이크를 설치하고, 그 위에 악보처럼 애창곡 가사가 쓰인 화첩을 펼쳐 두었다. 이처럼 작가는 애창곡을 화면에 옮겨 쓰고,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매체로 결합하고 편집해 표현한다. 이를 통해 시서화의 전통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융합하고 현대화하는 작가만의 표현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애창곡 愛唱曲>, 2010/2024, 장지에 수묵채색, 혼합매체, 가변설치
<애창곡>(2010)은 12점의 회화 연작과 영상, 화첩으로 구성된 복합 설치 작업으로, 작가가 좋아하는 사랑을 주제로 한 가요의 노랫말이 담긴 작업이다. 12점의 커다란 회화에는 오방색과 형광색 선과 함께 ‘색동 꽃’이 그려져 생동감 넘치는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거대한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 화면을 압도하는 가운데, 꽃 사이로 작가의 애창곡의 가사가 채워졌다. 패티 김의 ‘그대 없이는 못살아‘의 가사 “좋아해”는 짙은 먹으로 추사체와 유사하게 크고 강하게 표현되어 있고, 백설희의 ‘봄날은 간다’,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등의 가사는 비슷한 듯 다른 서체와 크기로 쓰여 한글의 미학을 전달한다.
이와 함께 작가는 색동 새가 날아다니는 영상을 배경으로 스탠드 마이크를 설치하고, 그 위에 악보처럼 애창곡 가사가 쓰인 화첩을 펼쳐 두었다. 이처럼 작가는 애창곡을 화면에 옮겨 쓰고,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매체로 결합하고 편집해 표현한다. 이를 통해 시서화의 전통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융합하고 현대화하는 작가만의 표현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같이 홍지윤의 작업은 유희(遊戱)로부터 시작되며, 작가는 여유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이어 나가려 한다. 이러한 유희적 태도를 통해 작가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며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낸다.
<애창곡 愛唱曲>, 2010/2024, 장지에 수묵채색, 혼합매체, 가변설치
<애창곡>(2010)은 12점의 회화 연작과 영상, 화첩으로 구성된 복합 설치 작업으로, 작가가 좋아하는 사랑을 주제로 한 가요의 노랫말이 담긴 작업이다. 12점의 커다란 회화에는 오방색과 형광색 선과 함께 ‘색동 꽃’이 그려져 생동감 넘치는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거대한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 화면을 압도하는 가운데, 꽃 사이로 작가의 애창곡의 가사가 채워졌다. 패티 김의 ‘그대 없이는 못살아‘의 가사 “좋아해”는 짙은 먹으로 추사체와 유사하게 크고 강하게 표현되어 있고, 백설희의 ‘봄날은 간다’,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등의 가사는 비슷한 듯 다른 서체와 크기로 쓰여 한글의 미학을 전달한다.
이와 함께 작가는 색동 새가 날아다니는 영상을 배경으로 스탠드 마이크를 설치하고, 그 위에 악보처럼 애창곡 가사가 쓰인 화첩을 펼쳐 두었다. 이처럼 작가는 애창곡을 화면에 옮겨 쓰고,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매체로 결합하고 편집해 표현한다. 이를 통해 시서화의 전통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융합하고 현대화하는 작가만의 표현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같이 홍지윤의 작업은 유희(遊戱)로부터 시작되며, 작가는 여유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이어 나가려 한다. 이러한 유희적 태도를 통해 작가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며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낸다.
-2F 밖 홍지윤의 작품 세계에서 '꽃'의 모티프는 2008년경 '색동 꽃'의 이미지로 도상화된 후 점차 강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수많은 꽃잎이 모여 하나가 된 '꽃'은 동양과 서양, 음과 양의 이분법적 대립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인 '겹'에 주목하는 작가의 예술관을 표현하는 상징적 소재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색동 꽃의 시기별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접시꽃 들판에 서서>(2014)는 통일신라시대의 개혁주의자 지식인 최치원을 오마주해 그의 시 「촉규화(蜀葵花, 접시꽃)」을 모티브로 제작한 작품이다. 이 작업을 기점으로 홍지윤의 꽃은 보다 원색적인 색감과 함께 평면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별들의 편지(좌, 우 - 나를 위해 남은 너 / 중앙 - 너를 위해 떠난 나>, 2015, 캔버스에 아크릴릭, 162x130cm(좌, 우) / 220x160cm(중앙)
(자작시)
별들의 편지 / 홍지윤
<별들의 편지(좌, 우 - 나를 위해 남은 너 / 중앙 - 너를 위해 떠난 나>, 2015, 캔버스에 아크릴릭, 162x130cm(좌, 우) / 220x160cm(중앙)
(자작시)
별들의 편지 / 홍지윤
별들이 나에게 편지를 쓴다.
밤을 무기 삼아 숨죽인 채 타오르는 나무.
곁을 빛 삼아 나는 편지를 읽는다.
엉겨 피던 꽃송이들이 즐겁게 낙화하였다.
하루가 지나고 영원이 되었을 때
네가 영원히 떠나버리겠다고 했다.
그 말의 뒤를 다르던 발자국이 분분히 부스러졌다.
망측한 괴물과 놀던 꽃들은 부둥켜안고 괴물이 되었고
꽃과 놀던 괴물들은 제 본분을 잊고 꽃이 되어버렸다.
하루가 지나고 영원이 되었을 때
별들이 나에게 편지를 쓴다.
밤을 무기 삼아 숨죽이고 타오르는 나무.
나를 위해 남은 너는 영원이 되었고
너를 위해 떠난 나는 꽃을 잊었다.
</span>
 <접시꽃 들판에 서서>, 2014, 캔버스에 아크릴릭, 220x140 (4ea)
<접시꽃 들판에 서서>(2014)는 작가가 통일신라시대의 개혁주의자 지식인 최치원을 오마주해 그의 시 「촉규화(蜀葵花, 접시꽃)」을 모티브로 제작한 작품이다. 꽃잎과 씨앗의 모양이 접시를 닮은 크고 화려한 접시꽃은 신라시대에 촉규화(蜀葵花)라고 불렸다. 『동문선(東文選)』의 『삼한시귀감(三韓詩龜鑑)』에 수록된 「촉규화」는 어려서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성공했지만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신분의 장벽으로 고독하게 살았던 최치원이 자신의 회한을 접시꽃에 투영하여 읊은 시이다.작가는 캔버스 화면 오른쪽 상단에 최치원의 시를 한자 원문으로 필사하고, 최치원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꽃에 대한 예찬, 작가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 등을 담은 자작시 「접시꽃 들판에 서서」를 화면 왼쪽 상단에 써 내려간다. 이처럼 작가는 접시꽃 군락과 최치원의 시, 그리고 자신의 시를 화면 위에서 조화롭게 구성하며 최치원의 삶을 축복한다. 이 작품은 2014년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기획전 《풍류탄생(風流誕生) - 최치원》에 출품되었다.
<접시꽃 들판에 서서>, 2014, 캔버스에 아크릴릭, 220x140 (4ea)
<접시꽃 들판에 서서>(2014)는 작가가 통일신라시대의 개혁주의자 지식인 최치원을 오마주해 그의 시 「촉규화(蜀葵花, 접시꽃)」을 모티브로 제작한 작품이다. 꽃잎과 씨앗의 모양이 접시를 닮은 크고 화려한 접시꽃은 신라시대에 촉규화(蜀葵花)라고 불렸다. 『동문선(東文選)』의 『삼한시귀감(三韓詩龜鑑)』에 수록된 「촉규화」는 어려서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성공했지만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신분의 장벽으로 고독하게 살았던 최치원이 자신의 회한을 접시꽃에 투영하여 읊은 시이다.작가는 캔버스 화면 오른쪽 상단에 최치원의 시를 한자 원문으로 필사하고, 최치원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꽃에 대한 예찬, 작가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 등을 담은 자작시 「접시꽃 들판에 서서」를 화면 왼쪽 상단에 써 내려간다. 이처럼 작가는 접시꽃 군락과 최치원의 시, 그리고 자신의 시를 화면 위에서 조화롭게 구성하며 최치원의 삶을 축복한다. 이 작품은 2014년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기획전 《풍류탄생(風流誕生) - 최치원》에 출품되었다.



-2F 안 <음유, 낭만, 환상 - 원효로와 청파동에서> (2007)는 작가가 청파동 작업실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와 그림, 영상 등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이 무렵 선명한 원색과 형광 색상을 과감하게 사용하여 기존의 규범을 뛰어넘으면서도 동양화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홍지윤의 작업의 특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커다란 화면 위에는 먹과 형광 안료가 혼합된 화려한 색채로 그려낸 꽃과 함께 작가가 지은 시의 구절이 겹쳐져 있다. 회화 앞에 설치된 거대한 한지 책 위로 투사되는 영상에도 꽃과 새, 오방색, 시, 문자, 자화상 등 다양한 이미지가 비친다. 이처럼 작가는 시와 글씨가 기반이 되는 수묵화를 탐구하며 동양의 전통적인 정서를 재해석하며, 아날로그적 요소와 디지털적 요소를 결합시켜 현대화된 동양화를 선보인다.
 <음유, 낭만, 환상 - 원효로와 청파동에서>, 2007, 혼합매체, 가변설치
<음유, 낭만, 환상 – 원효로와 청파동에서>(2007)는 작가가 청파동 작업실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와 그림, 영상 등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작가는 2007년에 15년 동안 사용하던 홍대 앞의 작업실을 떠나 청파동으로 이사했다. 홍대 앞과는 다른 느림과 고요함이 있는 이곳에서 작가는 새로운 에너지를 받게 되었다. 언덕 위 작업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해가 뜨기 전의 짙푸른 하늘빛, 지붕 위에 내려앉아 우는 작은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있는 청파동은 음악과 시를 좋아하는 작가에게 시상(詩想)으로 충만한 공간이었다.
<음유, 낭만, 환상 - 원효로와 청파동에서>, 2007, 혼합매체, 가변설치
<음유, 낭만, 환상 – 원효로와 청파동에서>(2007)는 작가가 청파동 작업실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와 그림, 영상 등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작가는 2007년에 15년 동안 사용하던 홍대 앞의 작업실을 떠나 청파동으로 이사했다. 홍대 앞과는 다른 느림과 고요함이 있는 이곳에서 작가는 새로운 에너지를 받게 되었다. 언덕 위 작업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해가 뜨기 전의 짙푸른 하늘빛, 지붕 위에 내려앉아 우는 작은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있는 청파동은 음악과 시를 좋아하는 작가에게 시상(詩想)으로 충만한 공간이었다.
커다란 화면 위에는 먹과 형광 안료가 혼합된 화려한 색채로 그려낸 꽃과 함께 작가가 지은 시의 구절이 겹쳐져 있다. 작가는 수많은 꽃잎이 모여 하나가 된 꽃이 자신의 예술세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소재라고 보았다. 회화 앞에 설치된 거대한 한지 책 위로 투사되는 영상에도 꽃과 새, 오방색, 시, 문자, 자화상 등 다양한 이미지가 비추어진다. 이를 통해 작가는 지나가버린 그리운 것들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것들, 보고 싶거나 되고 싶은 것들을 모두 담아낸다. 이처럼 작가는 시와 글씨가 기반이 되는 수묵화를 탐구하며 동양의 전통적인 정서를 재해석하며, 아날로그적 요소와 디지털적 요소를 결합시켜 현대화된 동양화를 선보인다.
</span>


 <인생은 아름다워>, 2001-2008, 혼합매체, 가변설치
<인생은 아름다워>(2008)는 삶에 대한 작가의 열정과 환희의 감정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화첩과 드로잉, 영상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에 청파동으로 작업실을 옮긴 후 작가는 작업의 형식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며 감성에 집중하게 되었다. 낭만적인 기질과 풍부한 감성을 지닌 작가는 동양의 자연관에 기반을 두고 삶과 사랑, 시간에 대해 노래했다. 책상 위로 투사되는 영상은 작가가 화첩 표지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문장을 쓰는 모습으로 시작해, 화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자작시 「꿈결같은 인생」과 「그녀, 아름다운 꽃」을 써내려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작가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인생을 바라보는 신념을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작업이다.
<인생은 아름다워>, 2001-2008, 혼합매체, 가변설치
<인생은 아름다워>(2008)는 삶에 대한 작가의 열정과 환희의 감정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화첩과 드로잉, 영상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에 청파동으로 작업실을 옮긴 후 작가는 작업의 형식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며 감성에 집중하게 되었다. 낭만적인 기질과 풍부한 감성을 지닌 작가는 동양의 자연관에 기반을 두고 삶과 사랑, 시간에 대해 노래했다. 책상 위로 투사되는 영상은 작가가 화첩 표지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문장을 쓰는 모습으로 시작해, 화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자작시 「꿈결같은 인생」과 「그녀, 아름다운 꽃」을 써내려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작가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인생을 바라보는 신념을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작업이다.
-B1 밖 <분홍인생>(2020)은 멕시코의 소설가 라우라 에스키벨(Laura Esquivel)의 소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Como agus para chocolate> (1989)에서 영감을 받은 작업이다. 이 소설은 멕시코 요리의 향긋한 냄새와 맛을 통해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1993년 영화로도 각색되었다. 홍지윤은 이 소설과 영화를 보며 의상실 '스왕크(Swank)'에서 젊은 날을 보냈던 어머니와 그곳에서 자란 작가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분홍 인생>은 영화의 장면들을 그린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2020)과 <스왕크>(2019-2020)라는 두 공간으로 구성된다.
 <분홍인생(粉紅人生)>, 2020/2024, 혼합매체, 가변설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의 새빨간 벽면에는 검은 먹 선만으로 주인공 티타와 연인 페드로의 표정과 동작, 상황을 포착한 수묵화와 소설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필사한 글귀가 채워져 있다. 그 앞으로는 글과 그림을 수놓은 비단 천과 책, 오브제가 함께 보인다. 그 옆 <스왕크>의 공간은 온통 분홍빛이다. 작가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의상실인 스왕크에서 보았던 패턴과 천, 가위, 초크가 놓인 하얗고 넓은 작업대, 장식장을 이 공간에 다시 재현했다. 화려한 샹들리에를 중심으로 천장에서 바닥까지 펼쳐지는 분홍색 꽃과 재봉틀 등 작가의 기억에서 소환된 오브제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분홍인생(粉紅人生)>, 2020/2024, 혼합매체, 가변설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의 새빨간 벽면에는 검은 먹 선만으로 주인공 티타와 연인 페드로의 표정과 동작, 상황을 포착한 수묵화와 소설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필사한 글귀가 채워져 있다. 그 앞으로는 글과 그림을 수놓은 비단 천과 책, 오브제가 함께 보인다. 그 옆 <스왕크>의 공간은 온통 분홍빛이다. 작가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의상실인 스왕크에서 보았던 패턴과 천, 가위, 초크가 놓인 하얗고 넓은 작업대, 장식장을 이 공간에 다시 재현했다. 화려한 샹들리에를 중심으로 천장에서 바닥까지 펼쳐지는 분홍색 꽃과 재봉틀 등 작가의 기억에서 소환된 오브제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어머니가 없는 지금, 작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어머니를 떠올렸고, 어머니와 자신, 스왕크를 하나로 이어주는 매개체인 ’색동 꽃‘을 활용해 공간을 수놓았다. 수묵 드로잉과 회화, 그래픽, 영상, 오브제가 복합적으로 설치된 공간은 화려함과 함께 공허함, 슬픔도 느끼게 한다. <분홍인생>에서 작가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과 <스왕크>를 교차시키며 시공간을 초월한 여성의 삶을 그려낸다.


-B1 안 홍지윤은 전통과 현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미디어 작업을 지속해왔다. 백령도에서 이루어진 설치, 퍼포먼스, 영상이 결합된 작업 <어진 바다 - 화려한 경계>(2012)와 드로잉 퍼포먼스를 촬영한 다큐 형식의 영상 <난무>(2009) 등 다양한 영상 작업을 시도한다. 특히 2018년 '평창 문화올림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광화문에서 상영된 미디어 파사드 작업 <빛나는 열정>(2017)은 홍지윤 고유의 서체와 화풍이 담긴 미디어를 건물 외관에 투사한 작업이다. 작가는 이처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과 동시에 공공미술 또한 활발히 시도함으로써 예술의 영역을 넓혀 나간다.
 <어진 바다 - 화려한 경계>, 2012,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5분 32초
<어진 바다 – 화려한 경계>(2012)는 백령도에서 이루어진 설치, 퍼포먼스, 영상 작업이다. 2012년 인천아트플랫폼의 입주 작가였던 홍지윤은 인천 최북단에 위치한 섬이자 천혜의 자연과 군사분계선이 공존하는 백령도의 ’사곶 사빈‘에서 이 작업을 촬영했다.
<어진 바다 - 화려한 경계>, 2012,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5분 32초
<어진 바다 – 화려한 경계>(2012)는 백령도에서 이루어진 설치, 퍼포먼스, 영상 작업이다. 2012년 인천아트플랫폼의 입주 작가였던 홍지윤은 인천 최북단에 위치한 섬이자 천혜의 자연과 군사분계선이 공존하는 백령도의 ’사곶 사빈‘에서 이 작업을 촬영했다.
작가는 황량한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세워진 빨랫줄에 자신의 작품이 프린트된 여성의 옷과 군복, 그림을 한 줄씩 널어놓는다. 경계를 상징하는 빨랫줄은 한국의 군사분계선 부근에 위치한 백령도의 지리적 경계이자 정치적 경계이며, 작가에게는 현실의 삶과 내면의 마음, 그리고 예술의 경계를 의미한다. 어느 새 백령도 바닷가의 파도 소리와 거친 바람에 날리는 빨래 사이로 장고춤을 추며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여성 무용수가 등장한다. 여인의 장고소리는 점차 파도, 바람소리와 섞여 자연스럽게 하나의 소리로 합쳐진다. 군복 천으로 만든 한복을 입고 유연하게 경계를 넘나드는 여성은 무수한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작가의 바람이 담겨 있는 듯하다. 영상의 말미에는 바닷가 풍경을 뒤로 하고 작가의 자작시와 글씨, 화려한 ’색동 꽃‘이 나타나며 마무리된다.
이 작품은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 《평화의 바다 – 물 위의 경계》에 출품되었다.
-1F <별, 꽃, 아이> (2024)는 이번 전시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신작으로, 여기서 작가는 지금, 현재에 대한 사유를 담아 색다른 작업 방식을 보여준다. 이 작업은 아이패드를 사용한 드로잉에서 시작해, 다시 회화로 옮겨진 '아날로그적 디지털, 디지털적 아날로그'라고 명명할 수 있다. 작품 속의 새까만 배경 위로 눈부시게 반짝이는 별, 시공간을 초월한 듯 공간을 부유하는 낭만적인 꽃과 사랑스러운 자화상, 글귀 등이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형상들은 정사각형의 틀 안에서 각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각 작품들은 서로 융합하며 하나의 커다란 세계를 이루고 있다.

 <별, 꽃, 아이>, 2024, 캔버스에 아크릴릭, 160x160cm (24ea)
<별, 꽃, 아이>(2024)는 이번 전시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신작으로, 작가 홍지윤의 ‘지금, 현재’의 사유와 색다른 작업 방식을 통해 동시대적 감수성을 전한다. 이 작업은 아이패드를 사용한 드로잉에서 시작해, 다시 회화로 옮겨진 ‘아날로그적 디지털, 디지털적 아날로그’라고 명명할 수 있다. 작품 속의 새까만 배경 위로 눈부시게 반짝이는 별, 시공간을 초월한 듯 공간을 부유하는 낭만적인 꽃과 사랑스러운 자화상, 글귀 등이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형상들은 정사각형의 틀 안에서 각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각 작품들은 서로 융합하며 하나의 커다란 세계를 이루고 있다.
<별, 꽃, 아이>, 2024, 캔버스에 아크릴릭, 160x160cm (24ea)
<별, 꽃, 아이>(2024)는 이번 전시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신작으로, 작가 홍지윤의 ‘지금, 현재’의 사유와 색다른 작업 방식을 통해 동시대적 감수성을 전한다. 이 작업은 아이패드를 사용한 드로잉에서 시작해, 다시 회화로 옮겨진 ‘아날로그적 디지털, 디지털적 아날로그’라고 명명할 수 있다. 작품 속의 새까만 배경 위로 눈부시게 반짝이는 별, 시공간을 초월한 듯 공간을 부유하는 낭만적인 꽃과 사랑스러운 자화상, 글귀 등이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형상들은 정사각형의 틀 안에서 각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각 작품들은 서로 융합하며 하나의 커다란 세계를 이루고 있다.
<별, 꽃, 아이>는 시서화 일체의 개념을 재해석하는 작가 특유의 작업 방식을 잘 보여준다. 작가는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과 연옥을 거쳐 다다른 천국과 가장 가까운 현실의 모습이 ‘별, 꽃, 아이’라고 표현된 것에 영감을 받아 이를 작품에 시각화하고, 화면 곳곳에 『신곡』의 텍스트를 함께 적었다. 이와 더불어, 윤동주의 <서시>에서 시인이 헤아리던 별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사랑과 희망을 담은 시구를 그림과 함께 배치했다. 이를 통해 작가는 동서고금이 공존하는 가운데 무한하게 확장되는 사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내용은 전시 소개 자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The above is an excerpt from the exhibit introduction.